플랫폼 기업보다 '기술 독립성·생태계 기여도' 중심 평가
[메가경제=황성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사업에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엔씨소프트(NC) AI, KT, 카카오 등 총 15개 팀이 공모에 참여했지만, KT, 카카오 등 기존 ICT 강자들이 최종 관문을 넘지 못했다.
두 기업 모두 해외 빅테크 기업과 AI 공동 개발한 것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이며, 중소 스타트업과 비(非)통신계열 기업들이 포함되며 AI 산업 내 ‘세대교체’ 가능성도 예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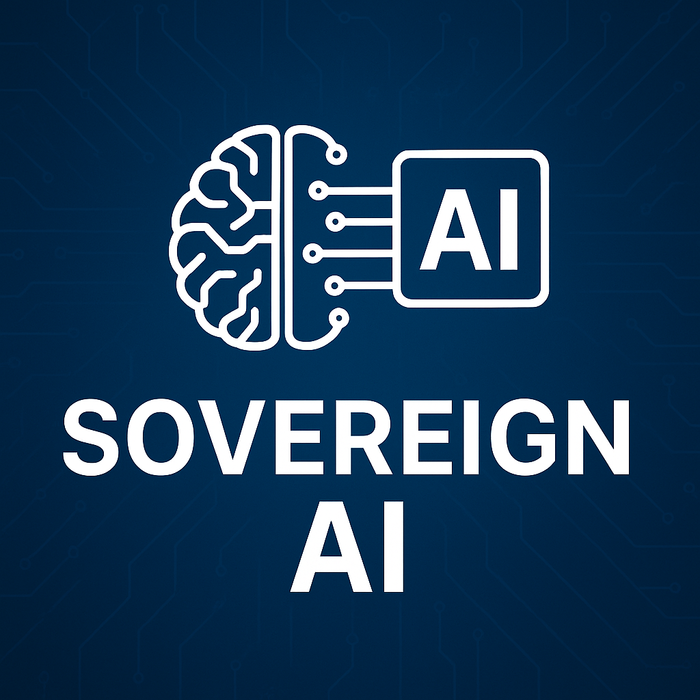 |
| ▲소버린 AI 가상 이미지. [사진=챗GPT] |
◆ 5개 컨소시엄 최종 사업자로 선정…기술력과 전략성 모두 잡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프로젝트 네이버, LG AI연구원, SK텔레콤, NC AI, 업스테이지 등 5개 컨소시엄(정예팀)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AI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육성하겠다는 국정기조 하에 소버린 AI 정책을 발표했다. 소버린 AI는 주권(Sovereign)과 AI를 결합한 개념으로, 외국 기술 의존 없이 자국 인프라·데이터·인력·기술로 AI를 독자 개발해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뜻한다.
정부는 해당 정책의 핵심 목표로 ▲데이터 주권 확보 ▲기술 자립 및 디지털 안보 강화 ▲산업 경쟁력 제고 ▲문화적 정체성 유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약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총 15개 팀이 참여한 이번 공모는 서면 평가를 거쳐 10개 팀이 1차로 선정됐고, 이후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5개 팀이 압축됐다. 사업 참여 경험, 기술 성숙도, 모델 개발·운영 능력 등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이 최종 '정예팀'으로 선정됐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자체 인프라와 초대규모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고성능 언어모델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업스테이지는 자체 LLM ‘솔라’를 공개하고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선 대표적인 스타트업이다.
SK텔레콤은 ‘에이닷’을 중심으로 한 AI 서비스 운영 경험과 데이터 운영 역량이 강점으로 꼽힌다. LG AI연구원은 국내 최초 멀티모달 초거대 AI ‘엑사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AI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NC AI는 게임 AI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몰입도를 높인 모델 개발에 특화돼 있다.
◆ KT·카카오 탈락…'AI 패권구도' 지각변동 예고
반면, AI 언어모델 '믿음 2.0'과 '카나나' 등을 운영 중인 KT와 카카오는 사업자에서 탈락했다.
이번 사업의 목표는 소버린 AI로, 글로벌 빅테크의 독점적 AI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 고유의 언어·문화·데이터에 최적화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해외 개발사와의 협업을 하고 있는 두 회사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게 업계 측 입장이다. 업계에선 KT나 카카오가 기술력이 부족했다기 보다는 정부가 원하는 ‘개방형 기술 생태계’나 ‘공공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점을 보였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KT와 카카오처럼 AI 서비스 분야에서 존재감이 컸던 기업들이 빠지고, 업스테이지나 NC AI 같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주체들이 포함된 점은 AI 주도권이 기술 독립성과 국산화 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 소위 ‘AI 판의 빅5’가 새롭게 형성된 셈이다.
◆기술 중심 생태계 재편…국산 AI 도약 발판될까
선정된 5개 기관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정부의 대규모 예산 지원과 함께 국산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시제품이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단발성 지원이 아닌, 디지털플랫폼정부, AI 반도체, 클라우드 전환 등 전방위 디지털 전환 정책과 연계된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민간 통합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산 AI 모델을 국가 인프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기술 중심의 AI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기존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기술 독립성과 연구 역량이 중심이 되는 ‘AI 생태계의 세대교체’가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AI는 글로벌 빅테크나 국내 플랫폼 대기업의 영역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기술 중심의 팀이 경쟁력을 인정받는 시대가 됐다”며 “누가 먼저 만들었느냐보다, 누가 더 잘 다듬고 생태계에 기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