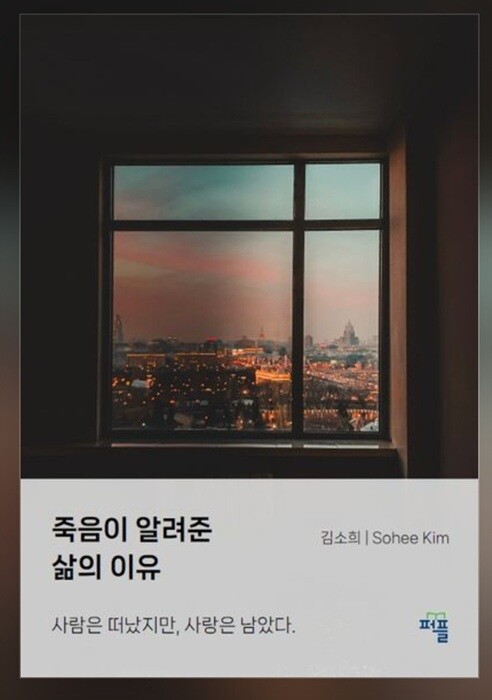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죽음은 늘 멀리 있는 이야기 같았다. 장례식장에서 잠시 마음이 저릿해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간다. 그러나 김소희 작가에게 죽음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온기를 품고 있던 사람, 누구보다 따뜻했던 사랑하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순간, 삶의 중심은 거칠게 무너졌다. 예고 없이 찾아온 이별은 그에게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남겼고, 그 질문 끝에서 마침내 한 권의 책이 탄생했다. '죽음이 알려준 삶의 이유'는 상실의 시간을 통과한 한 사람이 다시 삶을 붙잡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진실한 기록이다.
작가는 말했다. “영원할 거라 믿었던 사랑도 끝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병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잡고 있던 손이 천천히 식어갈 때, 세상은 조용히 멈춰섰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어린 시절 집 앞 은행나무 아래에서 환하게 웃으며 기다려주던 할머니의 모습, “금쪽같은 내 손녀딸”이라며 건네던 다정한 목소리, 어떤 폭풍 속에서도 등을 지켜주던 단 하나의 사람이었다.
상실은 시간을 밀어내지 않았다. 슬픔은 날마다 다른 얼굴로 몰아쳤고, 밤의 적막은 숨을 가쁘게 만들었다. 그러나 길고 조용한 시간을 지나며 작가는 깨달았다. 죽음은 사랑을 데려가지 못한다는 것. 떠난 것은 몸이었지만, 남겨진 것은 여전히 따스하게 살아 있었다. 기억 속 할머니의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했고, 작가는 알게 되었다. 죽음은 삶을 닫는 결말이 아니라, 삶의 이유를 다시 묻는 시작이라는 것을.
그 질문의 끝에서 탄생한 책이 '죽음이 알려준 삶의 이유'다. 이 책은 단순히 상실의 감정을 나열하거나 슬픔을 소비하는 에세이가 아니다. 가장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낸 뒤 무너지고, 바닥을 지나, 다시 살아가기 위해 손을 뻗었던 기록이다. 화려한 문장은 없다. 고통의 바닥에서 길어 올린 단단한 언어들로 채워졌고, 독자들에게 깊은 눈물과 조용한 용기를 건넨다.
김소희 작가는 말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사랑을 남기고 떠난 사람을 대신해, 남겨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시작이었다.” 할머니는 그의 곁에 없지만, 여전히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등불처럼 자리하고 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는 일, 그 책임이 삶을 붙잡는 힘이 되었다.
'죽음이 알려준 삶의 이유'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다. 상실을 겪은 사람뿐 아니라 오늘을 버티며 살아내는 모든 이들에게 조용히 손을 내민다.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